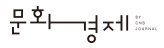'잔칫날'로 잘 알려진 화가 이두식(66)이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인사동 선화랑에서 초대전을 연다. 1988년 선미술상 수상 이후 24년 만에 인사동에서 펼치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국내에서 실로 오랜만에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더욱이 지난해 타계한 고 김창실 선화랑 대표의 마지막 기획 전시로 알려져 그 의미가 더하고 있다. 이두식 작가의 '잔칫날(Festival)'은 1988년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착하고 있는 연작으로 대담한 운필을 강조해 즉흥적인 감흥을 담아낸 대표작으로 음악적 요소와 춤을 추듯 듯 한 리듬감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화면 대부분을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는 기존의 화려한 채색과 함께 수묵화에 등장하는 먹의 농담과 여백을 강조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서양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 고유만의 수묵화 정신을 탐구하고, 먹의 농담과 선의 운필 그리고 과거 수묵화를 그렸던 선인들의 정신성을 작품에 녹여내 추상화 같이 표현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화려함에 먹의 농담을 작품에 들여놓은 것에 대해 "우리 생활의 풍류, 생활의 여유인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시작한 추상이라는 것이 동양의 문인화인 수묵과 개념적으로 통하는 것 같다"며 "나이가 들어서인지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 것에 대한 감성이 나를 이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잔칫날' 시리즈는 1972년 당시 '무제(舞際)'라는 제목으로 국전에 특선을 한 작품명이었다. 이 작업의 모티브는 과거 지방에서 본 장례식에 사용된 상여라고 전한다. 꽃상여에 매달린 화려한 오방색의 천들과 단청의 색상이 슬픔 속에서도 가장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여 죽음을 승화시킨 주된 이유가 바로 화려한 색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의식에서 찾아낸 화려함은 그 동안 '잔칫날'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화 되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도시의 오후', '도시에 찾아든 잠자리' 같은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생전에 만점의 작품을 그린다"는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두식 작가는 현대인의 위축된 마음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잠시나마 위로하기 위해 원색을 과감하게 쓰는 뜨거운 추상계열의 작업을 했고, 이것이 세계적 보편성에 다가가는 것이라 믿었다.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잔치에서 누군가는 꽹과리를 들고 누군가는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들과 그 환희를 2 차원 평면에 환원하는 작업과 함께 우리 고유의 정신이 담긴 선의 여백과 먹의 농담으로 그려낸 그의 작업은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작가의 감성이 가득 배어있다. 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