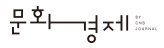(문화경제 = 이문정 미술평론가,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 더 갤러리 이번 회는 일상의 삶과 그 속에서 만나는 사물/존재에 주목하며 생성과 소멸, 순환을 회화와 입체 작업으로 담아내는 손승범 작가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 최근작 중 ‘사라지는 라오콘’(2020)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많은 사람이 이 작품에 관해 이야기했을 것 같다. 조각 작품을 회화로 재현한 뒤 그 위에 식물을 그린 작업에 대해 작가는 ‘고전적인 조각을 그린 뒤에 그것을 식물로 지운다’고 설명했다. ‘녹아내리는 피조물들’(2017)에서부터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2021)에 이르는 작품들은 영원할 것으로 믿어진 혹은 영원하길 바라는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설적인 동시에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전적인 조각과 돌은 영원성을, 식물이나 꽃은 일시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데 역으로 고정된 대상인 전자가 소멸, 자연을 담아내는 후자가 순환을 통한 영원을 상징하면서 완벽한 양가성을 담아낸다고 볼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든 생성과 소멸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주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녹아내리는 피조물들’은 버려진 화환을 해체한 후에 우레탄폼을 입힌 불규칙적인 형상으로 이뤄진 오브제들을 제단으로 만들었던 작품이다. 버려진 화환이라는 소재, 그 작업 과정에 생성과 소멸이 담겨 있다. 조각에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자주 봤던 십자가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같은 종교적 조각들에 부여된 의미를 곱씹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점차 종교적 조각 외의 조각에도 의미가 담겨 있으며, 나아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돌이나 잡초도 그와 같은 맥락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각상이 소유한 의미들이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사라지는 아기천사’(2016-2018) 시리즈처럼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최소단위의 모양 - 순간이동을 할 때 원자 형태로 나뉘어 사라지는 모습 - 들로 형상을 지워나갔다. 이후 각자의 아픔은 모두 다를 테니 다른 모양으로도 지워나가면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해지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형상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차 내가 키우던 시들어가는 관상식물과 같은 대상에 사라짐의 의미를 대입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발견한 잡초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고전적인 조각상을 잡초의 형상으로 지운 ‘사라지는 라오콘’, ‘사라지거나 자라나는’(2020), ‘투명하게 사라지는 믿음’(2020) 등을 그리게 되었다. 공간을 메우고 지워나가는 내 작업이 재개발 혹은 순환의 과정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어 흥미롭게 느껴졌다. 한편 ‘사라지거나 자라나는’에서는 납골당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꿈틀대는 비석’(2020)에서는 재개발 회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돌을 그렸다. 이 역시 생성과 소멸로 연결된다.


- 인물의 감정 상태가 표현되고 역동성이 강조되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과 바로크 시대의 조각 작품을 그린 뒤 잡초로 그 형상을 지워나간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라오콘(Laocoon)’(BC 150~BC 50년경)이나 ‘페르세포네의 납치(The Rape of Proserpina)’ (1621~1622)의 절규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모습들, 인물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역동성과 감정을 작품 속에 넣고 싶었다. ‘페르세포네의 납치’는 신화의 내용, 즉 페르세포네의 납치가 가져온 결과로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이전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면서 새로운 규칙이 생기는 이야기가 나의 작업 주제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신화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특히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가 보여주는 재현의 방식이 재미있게 다가와서 그의 작품들을 차용한 시리즈 작업을 이어 가는 것에 관해서도 고민 중이다. 현재도 진행 중인 작업이다.


- 멀리서 처음 봤을 때는 극사실적인 회화 같지만, 다시 보면 초현실적이기도 한 재현적 회화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초기부터 재현에 몰두하진 않았고 인물이 등장해도 캐릭터성을 가진 정도였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소외되거나 버려진 대상들을 그렸었고, ‘사라진 단원들’(2017)에서처럼 트로피를 소재로 선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상 작업이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서 가져온 아기 천사가 먼저 등장했는데 더 강한 이미지를 주는 규모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전 조각들을 차용하게 되었고, 세밀하게 표현된 조각의 볼륨감들을 화면에 그대로 담아내고 싶었다. 그때부터 점점 재현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참고로 일상의 사물이나 화환 등은 내가 직접 본 대상들이고 ‘라오콘’ 등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 잡초는 직접 채집하거나 사진을 찍어 관찰하는 방식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사진에서는 내가 느꼈던 생경한 감정들이 완벽히 담기지 않아 머릿속의 기억을 환기하거나 당시 적었던 글들을 읽으며 감정을 담으려 한다.


- 작가의 설명을 듣다 보니 작업에 종교적인 분위기도 담긴 것 같다. 작가 노트에서 “전통 조각의 도상들은 경건함과 소망과 같은 상징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잡초나 식물로 지워나감으로써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현시대에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짐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왜 고전 조각이 소망의 상징인지, 그리고 그것을 식물로 지워나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라지는 라오콘’의 경우 식물로 뒤덮이면서 오히려 그 존재감이 더 강조되어 보인다.
내가 차용하고 있는 조각들에 담겨 있던 과거의 의미들은 오늘날 관상용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겉모습만 유지되고 그 속의 의미들은 변화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계절에 따라 사라지고 자라나기를 반복하는 식물들에 대입해 보여주고자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가족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경험한 것 역시 생성과 소멸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게 했다. 나를 돌아보다가 내 주위에 수명이 다했다고 여겨져 버려지거나 소외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미술대회 트로피가 눈에 들어왔다. 어렸을 때와 달리 성인이 된 뒤 본 트로피는 가벼운 플라스틱 덩어리로 느껴졌다. 이것이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그렇다면 자연 풍경을 잡초로 지운 ‘잡초 I, II’(2020)의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
그 작품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 내가 평소 지나다니는 길가에 늘 보이는 나무인데 나에게 뭔가 안도감이나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 봤던 잡초도 비슷한 인상을 줘서 같은 느낌을 전해주는 형상들을 오버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했다.
- 손승범의 작품에 등장하는 잡초나 식물들은 상당히 정제되어 보여 일상의 길 위에서 만나는 잡초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설치 작업 역시 복잡한 구성을 가졌음에도 안정적으로 조율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잡초와, 근접해 관찰하는 잡초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다. 구조적으로 체계적이기도 하고 매우 복잡하다. 어지럽게 느껴질 정도로 복잡한 형상을 그리기 위해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때문에 정제된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설치의 경우 탑처럼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균형이 잡혀 보일 것 같다.

- 이전 전시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찾아지지만, 특히 ‘메마른 자리에서 자라나는’(2020)의 경우 전시장 설치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벽의 검은 원도 인상적이었다.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표현한 것 같다. 손승범의 작업 중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회화가 실제 공간에 그대로 재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18년도에 작가들과 ‘project 8x’라는 팀을 함께하게 되면서 서울 무악재나 중계동, 신설동과 같이 재개발이 진행되다 잠시 멈춘 지역에서 스캇(squat)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게릴라성 전시라기보다는 재개발 지역에 침입해 그곳의 물건들을 놀이의 형식으로 사용해보자는 의도였고 매우 즐겁게 참여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쉬워 오브제들을 작업실로 가져다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재개발 지역의 물건들을 재조합해 화이트 큐브에서 전시하면 실험적인 의미가 생성될 것 같았다. 마침 인천의 ‘대안공간 듬’에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프리뷰 개인전’(2020)을 진행했고 스캇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 원은 도형의 기본 단위이고, 전시된 오브제들은 사라지게 될 존재들이어서 전시장에 등장하는 검은 원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의미를 담았다. 수학여행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미소 짓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설치했다.
- 회화와 설치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설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16년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할 때 이전 작업실의 물건들을 다 옮겨 오니 너무 힘들었다. 당시 이삿짐을 포장했던 박스에 둘렀던 테이프를 뜯으면서 트로피처럼 형상을 만들어 나에게 선물한 작품이 있다. 그것이 입체 작품의 첫 시작이다. 또 함께 입주한 작가들의 영향도 받았다. 회화에서는 화면을 채워나가는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정제된 작품으로 완결된다. 그것을 벗어나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시기에 우레탄폼이라는 재료가 지닌 즉흥성과 우연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녹아내리는 피조물들’로 첫 설치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 한지에 색을 여러 번 올리는 전통 채색화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첫인상은 캔버스에 그린 것 같았다. 이는 단지 그림에 등장하는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매체와 표현 방식을 이어갈 예정인가? 입체 작업도 하기 때문에 회화를 벽에 걸지 않고 공간에 선보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 있을 것 같다.
다른 재료를 염두에 둔 적도 있었지만 재료를 바꾼다고 작품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이 내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해서 한국화 재료를 계속 사용할 것 같다. 물론 나에게 적합한 재료가 무엇인지 계속 실현하고 있고 그 결과로 과슈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작품 제작 방식을 고민하다 드로잉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서예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선을 이용한 드로잉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두꺼운 장지 위에 색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채색화 방식으로 그리다 보니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작품 양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한편 창살을 활용한 작업과 디스플레이들을 구상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일관되게 작가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나 형식이 있을까?
인터뷰에서 말했던 이슈 외에 평상시에 잊고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들을 나의 작업을 통해 인식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회운동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미학적으로든, 사회 문화적으로든 꽉 막힌 벽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