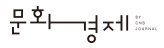(문화경제 = 이문정 미술평론가,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 더 갤러리 이번 회는 ‘정체성’과 ‘관계’를 다루는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조영주 작가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 조영주의 퍼포먼스는 전문적인 배우나 무용수가 등장하지 않아도 철저한 계획이 지켜지는 비즉흥적인 작업처럼 보인다. 영상 작업인 ‘꽃가라 로맨스’(2014), ‘워터리 마담’(2015), ‘DMG: 비무장 여신들’(2015)을 위해 진행된 퍼포먼스는 미술과 무관한 노년의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최선을 다해 계획대로 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진행한 퍼포먼스들은 라이브로 진행됨에도 우연의 요소가 더 적어지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안무가와 협업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미술로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에 즉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퍼포먼스는 행위의 계획이 거의 다 짜여있어 열려 있는 즉흥적인 여지가 많지 않다. 나와 안무가가 최종 계획을 확정하면 퍼포머들이 연습하고 그대로 실행한다. 그중에는 발자국 수까지 계산할 때도 있다. 한 명의 가수가 같은 곡을 여러 번 부를 때 조금씩 기교나 표현이 달라지는 정도의 여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내가 원하고 계획한 상황을 퍼포머의 몸을 통해 구현하거나 발현하기 위해서 안무가와 협업한다. 물론 작품의 콘셉트에 따라 협업 과정은 매우 다르지만, 최근 작업에서는 안무가와의 협업이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각각의 퍼포머들로부터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안무가이다. 전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 엑스(Unfold X) 2022’에서 진행한 이원 생중계 라이브 퍼포먼스 ‘이산 신체 재회’(2022)는 이산가족 상봉,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된 영상을 레퍼런스로 만들었다. 나는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장면, 분노해 화를 내고 따지는 장면들을 토대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다. 또 어려서부터 봤던 내 할머니의 행동들, 예를 들어 땅바닥에 앉아서 우시는 장면과 같은 이미지들, 한이 맺힌 동작들을 안무가에게 제안했다. 그러면 안무가는 나의 제안에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입술 위의 깃털’(2020)의 경우 내가 레슬링을 보면서 포착한 동작을 캡처해서 보여주면 안무가는 주짓수에도 유사한, 재미있는 동작이 있다고 덧붙였다. 작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내가 기획해 제안하면 안무가가 혼자 안무를 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

- 조영주의 최근 퍼포먼스를 보며 공연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한 게 막연히 미술관의 퍼포먼스에 즉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겠다.
알게 모르게 화이트 큐브에서의 퍼포먼스는 즉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플럭서스(Fluxus)에서 진행한 퍼포먼스들이 아직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어서인 것도 같다. 즉흥성과 행위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다 보니 공연을 볼 때 경험하는 스펙터클을 미술가의 퍼포먼스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나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관련해 누군가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
- 퍼포머는 전문 무용수가 많은가?
올해는 임은정 안무가와 4개의 신작을 발표했다. 아무래도 무용가가 많지만 현대무용가뿐 아니라 연극 배우, 미술 작가, 서커스단원 등 다양한 분들이 작품의 특성에 따라 참여했다. 2020년 루프에서 있었던 개인전 ‘코튼 시대(Cotton era)’와 ‘송은미술대상전’에서는 음악가와의 협업도 있었다.


- 연이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퍼포먼스에 지속적으로 담기는 주제나 행위가 있다면 무엇인가?
전작들이 그랬듯 나는 특히 근현대사의 여성 이미지와 관련해 우리가 본 것을 많이 참조한다. 내가 성장하며 봤던 모습, 그리고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참고한다. 나는 슬픔이나 재난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특정적인 신체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한국 여성들만이 가진 무언가가 있다. 내가 최근에 실험하고 싶었던 것은 생중계/라이브니스(liveness)이다. 예를 들어 ‘이산 신체 재회’는 현장에서 실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그것을 라이브로 송출했다. 퍼포먼스는 전시장의 두 군데에서 진행되었고, 각각의 퍼포먼스는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의 배경처럼 등장했다. 실시간 공연이 교차되는 것이다.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두 곳의 퍼포먼스를 보던 관객이 다른 곳의 퍼포먼스를 실제로 보기 위해 이동할 경우 몇 초일지라도 시간차를 경험하게 된다. 공연장이 아닌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관객이 침범하기도 한다.
- 일부 퍼포먼스에는 구조물이 등장한다.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2021)에는 흰 구조물이 등장했고 퍼포머들이 그것을 이용했다.
코너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던 ‘조영주 -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2013)에서부터 설치물이 퍼포먼스의 요소로 등장했다. 당시에 전시장의 한쪽 벽면이 쇼윈도처럼 투명한 유리로 이뤄져 밖에서도 안에 다 보였다. 나는 그 공간을 카페트, 드로잉, 설치로 채우고 유리 벽에는 텍스트를 붙였다. 이 모두는 설치로 구동되다가 내가 퍼포먼스를 할 때는 무대가 되었다. 한편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는 돌봄이란 커다란 주제로 설치,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토대로 완성한 영상 작품, 세 가지가 함께 제작되었다. 각각은 연관되어 있지만 독립된 작품이기도 하다. 경기도 미술관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노란 벤자민과의 동거’(2022)에 나오는 설치물 ‘휴먼가르텐’(2021)은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에도 등장했는데, 그 자체로 작품이다. 전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고, 불빛을 쬐면서 머물렀다. ‘노란 벤자민과의 동거’를 촬영해 영상 작품 ‘콜레레’(2022)를 완성했다.


- 모든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 촬영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독립된 영상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가?
이전에는 영상 작품을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촬영을 위한 퍼포먼스였던 거다. 최근에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그것을 촬영할 계획을 동시에 잡는다. 작년부터는 제목도 따로 붙였다. ‘노란 벤자민과의 동거’와 영상 작품 ‘콜레레’는 같은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실행하게 된 것은 팬데믹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전시장에 관객들을 부를 수 없어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다. 내가 그렇게 했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의 퍼포먼스나 공연을 그렇게 관람했다. 라이브 영상은 실시간에 함께 경험하는 것임에도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불만족이 생겼다. 자연히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 라이브 영상을 녹화해 다른 날 봐도 같은 영상인데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보게 될 때와 느낌이 다른 것도 신기했다. 실시간에 공존한다는 조건이 큰 차이를 가져왔다.
- 퍼포먼스를 단순히 기록한 영상과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은 다를 것이다.
명확히 구분된다. 기록 영상과 그것을 베이스로 한 싱글 채널 영상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영상 작품의 제목을 따로 붙이게 되었다. 관객과 현장의 퍼포먼스, 관객과 라이브 영상, 그리고 녹화 영상 사이의 관계는 모두 다르게 작동한다.
- 조영주의 퍼포먼스에는 만지거나 비비는 신체적 접촉이 자주 등장한다.
신체가 갖는 관계성을 다루다 보니 지속적으로 접촉이 생기는 것 같다. 서양 남성의 티셔츠를 입고 하룻밤을 잔 뒤 사진으로 기록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2006-2007)나 전시장에 온 사람들에게 서로 티셔츠를 바꿔입게 한 ‘Exchanging T-shirts’(2007, 2008)도 직접적인 피부 접촉과 다를 바 없는 작업이다.

- ‘노란 벤자민과의 동거’, ‘콜레레’는 마사지의 장면 같다.
돌봄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평생 돌봄을 해온 분들이 돌봄을 받는 상황이다. 돌봄을 조금 넓게 보면 식물과 동물을 향한 돌봄까지 확장된다. 꽤 많은 사람이 평생을 누군가를, 무언가를 돌본다. 이 작업에서 중요했던 것은 돌보는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주제, 돌봄을 받는 사람은 수동적인 객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 사이의 서로 다른 주고받기를 다루었다. 마사지라는 소재가 여기에 잘 어울렸다.
- 팬데믹 이후 퍼포먼스를 재개하기까지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코튼 시대’ 때 발표한 영상 작업인 ‘입술 위의 깃털’을 보고 고윤정 큐레이터가 전시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2021)에 초대했다. 영상 속 퍼포먼스는 순전히 영상 제작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퍼포먼스를 전시장에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지 말지, 관객의 수를 어느 정도로 한정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 최종적으로 실제 접촉이 있는 퍼포먼스를 수차례 진행했다. 힘들긴 했는데 팬데믹 이후라 관객들에게는 더 강렬하게 와닿았을 것 같다.
- 최근의 퍼포먼스를 보면 작가가 등장하지 않는다.
전체를 다 감독하고 컨트롤하는 데에 집중했다. 내 작품에 내가 등장할 때는 ‘유니버셜 콜라보레이터, 서울’(2008)처럼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신체만이 갖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 작품에선 인터뷰이인 내 옆에 서양 남성들이 나의 파트너인 것처럼 앉아있다.
- 미술가가 진행하는 퍼포먼스와 무용가가 진행하는 퍼포먼스와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협업하며 항상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협업하려면 그 차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미술은 아이디어를 구축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발생하게끔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장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흙, 금속, 레디메이드 그리고 몸, 무엇이든 동등한 예술적 재료이다. 나에게 몸은 여러 재료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무용은 몸이 가진 절대성, 고유성이 언제나 최상위에 있는 것 같다. 무용가들에겐 몸이 주재료이고 다른 요소들은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나는 여러 재료를 배합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