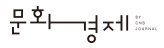경기도미술관에서 선보이는 ‘2025 동시대미술의 현장 기후 위기 특별전-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는 기후위기와 지구 온난화 대변동의 시대를 공감하고, 김형경 시인의 시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처럼 이류가 초래한 재난의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 소망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현장으로 초대한다.
참여 작가 중 아담 보이드는 ‘팰리세이드(Palisade)’ 작업을 통해 SF(공상과학) 장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이들이 충돌하는 가상의 장면을 작품에 담아낸다. 그의 작품은 촉각적 경험을 자극하며, 흔한 일상에서 우주까지 다양한 차원의 세계를 탐색하도록 이끈다. 호주의 작가 대니 멜러는 천문학 용어인 암흑별의 상징성을 차용한 ‘암흑별 폭포’ 작품을 통해 기후 위기와 자연의 웅장함, 그리고 인류세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민을 나누자고 권유한다.
아담 보이드, ‘팰리세이드(Palisade)’

영국 출신 작가 아담 보이드가 선보인 작품 팰리세이드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이미지 위에 전통적인 공예 기법인 펠팅과 퀼팅을 3D 프린팅, 라이다 스캐닝 기술과 결합한 다층적인 작업이다. 아담 보이드의 팰리세이드 연작에서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나 재현의 도구를 넘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개념적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이 작업은 갤러리 디스위켄드룸에서 개인전 ‘콜라이더’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팰리세이드 연작은 작가의 복합적인 작업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Palisade’는 울타리, 목책을 뜻하는 단어로, 작품의 형태와도 연결되지만, 동시에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를 탐색하는 작가의 태도를 상징한다.
그의 작업은 과거와 현재, 디지털과 아날로그,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낯선 감각을 느끼도록 만든다. 팰리세이드가 과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용으로 치던 말뚝 울타리라는 의미 외에도 강가나 해안을 따라 울타리처럼 나 있는 깎아지른 절벽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호와 절벽의 이중적인 의미를 함의하는 것처럼 작가의 작업은 낯선 감각을 깨운다.
팰리세이드 작품 이미지는 도시 풍경, 건축물, 빛의 산란과 같은 현상을 포착한 이미지와 추상적인 패턴이 뒤섞여 있다. 이는 현실의 특정 장소에서 포착된 이미지가 작가의 손과 기술을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와 질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라이다 스캐닝 기술로 얻은 디지털 이미지를 천에 프린팅하고, 그 위에 손으로 자수와 퀼팅 작업을 더하여 2차원 평면과 3차원 공간을 오가는 독특한 물성을 만들어낸다. 서정적 이미지처럼 느껴지는 풍경은 눈과 지각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는 정보를 취합하는 라이다 스캐닝 같은 디지털 렌즈를 사용해 도시와 교외 풍경을 촬영한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가공해 얇은 천 위에 인쇄한다. 다양한 색과 질감, 그리고 광택을 가진 천 조각은 바늘땀을 따라 연결되고 자르고 꿰매고, 뚫고, 겹치는 패치워크나 퀼팅과 같은 공예적 언어는 추상과 구상 사이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작가는 “전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 이를 전사한 패브릭, 천 위에 추상적 형태를 수놓은 자수를 합쳐 한 폭의 풍경을 완성하지요”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작업에서 사진이 수행하는 역할은 현실을 넘나드는 경계, 즉 팰리세이드 역할을 지닌다. 그가 포착한 일상적인 이미지는 비오는 날 창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 도시의 외벽 건물에 반사된 빛, 인공적인 빛이 존재하는 다양한 풍경을 드러낸다. 사진은 현실 세계의 특정한 순간과 장소를 기록한 증거물이 된다. 이 원본 에너지는 디지털 데이터로의 전환된다. 이 사진 데이터는 캔버스나 천에 UV 프린팅되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재출현하지만 이미 디지털화된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둔갑한다.
라이다 스캐닝으로 포착된 ‘현재’의 이미지와 펠팅과 퀼팅이라는 ‘과거’의 공예 기법을 통해 가공된 것으로 사진은 이러한 시간의 충돌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의 교차하는 팰리세이드 연작은 라이다 스캐닝을 통해 물리적 공간의 데이터를 얻고, 이를 가상의 편집 과정을 거쳐 다시 물리적 재료로 옮겨 놓는다. 사진은 이처럼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에 놓여있다.
대니 멜러, ‘암흑별 폭포(Dark Star Waterfall)’

전시장에 들어서면 이번 전시제목으로도 쓰인 김형영(1944~2021) 시인의 시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1992, 문학과지성사)의 시 ‘기다리는 님이 오지 않았기에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오지 않았기에/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았기에 나는 님을 누군지 알 것만 같다’를 만난다.
시를 읽고 전시장에 들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대니 멜러의 ‘암흑별 폭포’로 거대한 폭포의 낙하와 마주한다. 대니 멜러는 아카이브, 구전역사, 개인적인 상상력을 결합해 호주 퀸즈랜드의 역사적 진실, 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암흑별 폭포는 열대우림 국가의 광활한 풍경을 통해 원소의 엄청난 힘을 고찰하는 영상 작품이다. ‘암흑별’이라는 용어는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암흑 물질과 유사한 개념을 초기 천문학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영상 작품 안에는 호주의 소수민족인 디르발족의 사진 아카이브도 등장한다. 초기 천문학에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빛을 방출하지 않거나 흡수하지 않는 미지의 물질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암흑별과 같은 용어로 추측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대의 암흑 물질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대니 멜러의 작품에서도 암흑별은 초기 천문학자들이 미지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우주의 구성 요소를 상상하며 사용했던 용어다. 현대의 암흑 물질 개념처럼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가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거대한 자연의 힘과 존재에 대한 은유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암흑별 폭포는 올해 3월 호주의 퀸즈랜드아트갤러리(Queensland Art Gallery, QAG)에서 열린 개인전(Danie Mellor: marru | the unseen visible)에서 선보였던 작품이기도 하다. 마루는 모계 조상인 호주의 소수민족인 디르발족의 언어로 marru, 즉 ‘눈에 보이게 된다’는 뜻이다. ‘다니 멜러: 마루 |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는 기억과 기억, 원주민과 문화, 국가 간의 관계, 식민지 역사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는 전시였다.
암흑별 영상에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이미지는 호주 소수민족의 아카이브 이미지와 현대의 소스 이미지를 혼합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멜러는 시간의 폭포, 힘과 숭고함 등 자연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고대의 시간으로 이끈다. 이것은 현재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시각을 넓히길 제안한다. 원주민의 풍경과 창조에 대한 열대우림 전설에서 자연과 시간의 인식을 통해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숙고하길 권한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작가는 응가존지, 마무, 앵글로 켈트족의 조상과 퀸즐랜드 애더튼 태블랜드와 열대우림의 국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호주의 공유된 역사를 탐구하고 있다.
<작가 소개>
아담 보이드(Adam Boyd. b.1990)는 영국 출생으로, 런던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런던 슬레이드 미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글래스고 미술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글래스고에서 솔라리스틱스(2018), 신테스피어스(2019), 코즈널 스레드(2022) 등 세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2021년에는 아이슬란드 하프나르피오르두르에서 개인전(Strand Systems)을 열었다. 이 밖에 영국과 해외(서울, 도쿄, 홋카이도, 뉴욕, 레이캬비크)에서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 2022에 선정됐다. 서울 디스위켄드룸에서 아시아 첫 개인전(Collider)을 열었다.
대니 멜러(Danie Mellorb. b.1971)는 호주 출생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보랄에 거주하며 일한다. 퀸즐랜드 북부 맥케이에서 태어난 그의 모계 조상은 애서턴 테이블랜드와 케어스 지역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정착민 조상을 가진 원주민이며,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1900년대 초에 캘리포니아에서 호주로 이주했다. 그의 다학문적 연구와 실천은 현대와 역사적 문화 사이의 교차점과 문화적 기억과 지식의 유산을 탐구한다. NGA와 MCA 호주를 포함한 지역 및 모든 주 및 국가 컬렉션과 캐나다 국립 미술관, 대영 박물관 및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을 포함한 국제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멜러의 작품은 2019년 MCA 호주 조각 위원회, 호주 국립 미술관 회원의 2019년 인수 기금, 2009년 국립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예술상을 포함한 주요 상, 인수 및 커미션을 받았다. 2005년 호주 국립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ANU 국립 예술 연구소와 시드니 대학교 시드니 예술 대학에서 강사 및 수석 강사 직책을 맡았다.
글: 천수림(사진비평)
이미지 제공: 경기도미술관